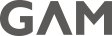자료실

도상봉, 폐허, 1953, 캔버스에 유채, 73x90cm, 경남도립미술관 소장
도상봉(都相鳳 1902-1977)은 1902년 함경남도 홍원에서 ‘덕흥상회’를 운영하던 거상 도명수(都明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도명수는 민족주의 투사이자 사업가였다. 도상봉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1918년 보성고등보통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 배척을 위한 동맹휴학에 앞장섰으며, 1919년에는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20년 한국인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高羲東 1886-1965)에게 서양화를 배우고, 1921년 일본 명치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미술로 전향하기로 마음먹고 가와바타 미술연구소에서 실기교육을 받은 뒤, 1922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다시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28년 귀국 후 도상봉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1948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며, 1949년부터 1961년까지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에는 거의 매년 개인전을 가질 정도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도상봉은 일본에서 습득한 아카데믹한 사실주의 화풍 기반의 회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조선미술전람회’에는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 전후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통해 한국 아카데미즘으로 자리 잡게 된 ‘고전적 구상화’를 추구하는 대표주자들로 도상봉을 비롯해 김인승, 이마동, 박득순 등이 있었다.
도상봉의 작품은 크게 인물, 정물, 풍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을 주 소재로 한 작품은 몇 점에 불과하고 주로 정물과 풍경으로 집약된다. 이 두 소재 가운데서도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룬 소재는 정물이다. 정물 중에서도 백자가 곁들여진 정물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도상봉의 호를 도천(陶泉), 즉 ‘도자기 샘’이라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1930년대 초 일본으로 유출되는 조선백자를 수집하기 위해 충무로에 도자기 상회를 열 정도로 도자기를 좋아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도상봉 화백은 도자기를 그린 게 아니고 도자기를 관조했다”라고 평하였다. 이렇듯 도상봉의 예술 세계를 이루는 근간이 백자를 보는 심미안으로부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도자기와 고적지 풍경 등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한국적인 정취와 미를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상봉의 <폐허>는 그의 작품 중 손꼽히는 명작이다. 1953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 폐허가 된 서울의 명동성당 일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명동성당을 비롯해 일부 남겨진 건물들과 화면 맨 아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 더미들은 그 형태의 대조를 통해 그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의 참담함을 가중해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황토색 그리고 회갈색들로 표현된 건물과 폐허, 이와는 대조되는 푸른 하늘과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흰 구름 그리고 여인네들과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절망 속에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과 삶의 희망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보면 구체적인 작품 제작 시기를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로 좁혀볼 수 있다.
도상봉은 작품의 소재나 표현 방법에서 안정감과 조화를 추구했던 작가였다. 그런데도 전쟁을 소재로, 그것도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가로서 6·26전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도상봉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한편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전
이전